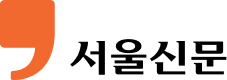외국인·재외교포 외국환거래 규정에 불만

“절차 불편… 여권도 너덜너덜”
은행 외환거래 내역 공유 않는 탓
“관광 활성화 위해서라도 개선을”
사업차 한국을 자주 오가는 50대 재미교포 A씨. 지난달 한국에 입국할 때 1만 달러를 원화(약 1150만원)로 환전한 그는 출국 전 남은 돈 300만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려 은행을 찾았다. 은행은 재환전을 해주며 여권에 ‘B은행 C과장, 재환전 USD 2560달러, 날짜’ 등이 적힌 도장을 찍어줬다. A씨는 “재외 한국인이나 사업가들은 자주 한국을 오가며 환전을 하는데 그때마다 도장에 내역을 찍는 바람에 여권이 너덜너덜하다”면서 “이렇게 불편한 절차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만 달러 이하로 ‘재환전’을 할 때 여권에 도장을 찍어 기재하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달러나 유로화 등 기타 외국 돈을 원화로 바꿔 한국에서 쓰고서 남은 돈을 다시 해당 국가 돈으로 바꾸려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외환 당국은 “외화 반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 간 전산 처리하면 되는 것을 굳이 여권에 도장을 찍는 것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관료주의”라는 불만도 크다. 최근 이탈리아 대사관 등에서도 거래은행 측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이내의 외국환을 매각하면 거래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단 원화기준 100만원 이하는 예외다. 또 1만 달러가 넘으면 은행에서 원화로 바꾼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외국인이 1500만원을 달러로 바꾸려는데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환전 관련 영수증이 없다면 여권에 기재하고서 1만 달러만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한국 돈을 들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여권번호 조회 등 관리가 안되고 외환 관리 체계도 달라 신분증인 여권에 ‘이 은행에서 돈을 바꿨다’고 증명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라면서 “현재 은행끼리 외환거래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만약 전산으로 대체하려면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출입국관리기록까지 확인해야 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수출 6위라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100%에 가까워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에 특히 관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금 세탁이나 부패 등 외화 반출이 걱정된다면 다른 정책을 보완하고 이런 세세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뿐 아니라 수출업체도 외환 대출을 계속 받으려면 전년도 수출 거래실적을 은행마다 일일이 떼서 합산하고서 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5-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