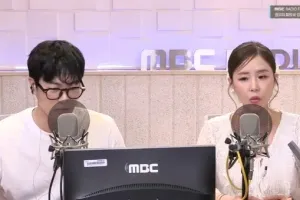공매도 공시제 실효성 논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공매도 세력은 드러나지 않고 중개 역할을 하는 ‘바지 사장’ 금융사만 공개되면서 공매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외국인 투자자와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의 ‘몸통’으로 지목된 외국계 헤지펀드는 공시에 드러나지 않았다. 헤지펀드는 프라임브로커리지(헤지펀드 전담 중개·대출·상담) 전문 외국계 금융사를 통해 공매도를 주문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만 모습을 드러냈다. 한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공매도 공시는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에서 하고 있다”며 “해외 법인에 문의한 결과 공시가 시행됐다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이 드러나지 않은 공시 제도는 의미가 없다며 온라인을 통한 공매도 폐지 청원 운동에 나섰다. 제도 도입 취지 중 하나가 공매도 세력에 정보 공개 부담을 안겨 투기를 억제하는 것인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28일까지 3% 이상을 유지하다 공시 제도 시행 하루 전인 29일 2.56%로 뚝 떨어졌고, 실제 첫 공시가 나온 지난 5일까진 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6일 공매도 비중은 3.45%로 증가해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도 공시를 피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리지를 이용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시제로 인해 국내 금융사 비용만 늘어날 뿐 공매도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금융사는 공매도 공시에 따른 투자전략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는 여전히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반면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국내 금융사는 숏(매도)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 경쟁 우려가 있다”며 “3거래일인 공매도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도 공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투자자는 30여개사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세력이 누군지 밝혀내는 것보다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