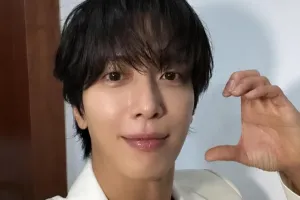лӘ…нқ¬м§„ мӮ¬нҡҢл¶Җ кё°мһҗ
мөңк·ј мқҳлЈҢкі„м—җ л•Ңм•„лӢҢ вҖҳм•ЎмһҗвҖҷ л…јлһҖмқҙ мқјм—ҲлӢӨ. ліҙкұҙліөм§Җл¶Җк°Җ вҖҳмқҳлЈҢлІ• мӢңн–үк·ңм№ҷ к°ңм •м•ҲвҖҷмқ„ мһ…лІ• мҳҲкі н•ҳл©ҙм„ң 비лЎҜлҗҗлӢӨ. лІ•лҢҖлЎңлқјл©ҙ 8мӣ”л¶Җн„° м „көӯмқҳ лӘЁл“ лі‘мӣҗмқҖ нҷҳмһҗмқҳ к¶ҢлҰ¬мҷҖ мқҳл¬ҙлҘј лӘ…мӢңн•ң м•ЎмһҗлҘј лі‘мӣҗ лӮҙм—җ кұём–ҙм•ј н•ңлӢӨ. н•ң лӢ¬ м•Ҳм—җ м•ЎмһҗлҘј лӢ¬м§Җ м•Ҡмңјл©ҙ 100л§Ңмӣҗ мқҙн•ҳмқҳ кіјнғңлЈҢлҘј л¬јм–ҙм•ј н•ңлӢӨ. мқҳмӮ¬л“ӨмқҖ мҰүк°Ғ л°ҳл°ңн•ҳкі лӮҳм„°лӢӨ.
мқҳмӮ¬л“ӨмқҖ н•ңлӘ©мҶҢлҰ¬лЎң вҖңм•ЎмһҗлІ•мқҖ мғҒмӢқвҖқмқҙлқјкі л§һм„ңкі мһҲлӢӨ. м•ЎмһҗлЎң кІҢмӢңн•ҙм•ј н• лӮҙмҡ©мқҖ мқҳлЈҢмқёмқҖ л¬јлЎ нҷҳмһҗл“ӨлҸ„ лӘЁл‘җ м•Ңкі мһҲлҠ”лҚ° көімқҙ м•ЎмһҗлЎң л§Ңл“Өм–ҙ лӮҙкұё н•„мҡ”к°Җ мһҲлҠҗлғҗлҠ” мЈјмһҘмқҙлӢӨ. ліөм§Җл¶Җ нҷҲнҺҳмқҙм§Җм—җлҠ” вҖңм „мӢңн–үм •вҖқмқҙлқјкұ°лӮҳ вҖң진лЈҢ мқҳм§ҖлҘј кәҫлҠ”лӢӨ.вҖқлҠ” л“ұмқҳ н•ӯмқҳкёҖ мҲҳл°ұкұҙмқҙ кј¬лҰ¬лҘј л¬јкі мҳ¬лһҗлӢӨ. м•ЎмһҗлІ•мқҙ мқҳмӮ¬ мІҙл©ҙмқ„ кө¬кёҙлӢӨлҠ” мқҳкІ¬лҸ„ мһҲлӢӨ.
мӢңлҜјл“Өмқҳ мһ…мһҘмқҖ лӢӨлҘҙлӢӨ. м•ЎмһҗлІ• мқҙм „м—җ мқҳмӮ¬л“Өмқҳ к¶Ңмң„м Ғ н–үнғңм—җ лЁёлҰ¬лҘј лӮҙнқ”л“ңлҠ” мӮ¬лһҢмқҙ м Ғм§Җ м•ҠлӢӨ. лӢ№м—°н•ң мЎ°м№ҳлҘј л‘җкі мқҳмӮ¬л“Өмқҙ мһҗмЎҙмӢ¬мқ„ м•һм„ёмӣҢ 분лһҖмқ„ л§Ңл“ лӢӨлҠ” м§Җм ҒлҸ„ мһҲлӢӨ. н•ң мӢңлҜјмқҖ вҖңнҷҳмһҗмқҳ к¶ҢлҰ¬лҘј лӘ…мӢңн•ң м•Ўмһҗк°Җ к·ёл ҮкІҢ л¬ём ңк°Җ лҗ к№Ң.вҖқлқјл©° вҖңлӮҙмҡ©мқҙ мғҒмӢқм Ғмқҙлқјл©ҙ к·ёкІҢ мҷң мқҳмӮ¬л“Өмқҳ к¶Ңмң„лӮҳ мІҙл©ҙмқ„ к№ҺлҠ”лӢӨлҠ” кІғмқём§Җ лӘЁлҘҙкІ 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мқҳмӮ¬мқҳ к¶Ңмң„ліҙлӢӨ нҷҳмһҗмқҳ к¶ҢлҰ¬к°Җ мҡ°м„ мқҙлқјлҠ” кІғлҸ„ мғҒмӢқмқҙм§Җл§Ң лҢҖл¶Җ분 м§Җмјңм§Җм§Җ м•Ҡкі мһҲлӢӨ. к·ёлҹ¬лӢҲ мқҳмӮ¬л“Өмқҙ вҖҳмғҒмӢқвҖҷмқ„ л§җн•ҙлҸ„ мӢңлҜјл“Өмқҙ лғүлӢҙн•ң кІҢ м•„лӢҗк№Ң. мғҒмӢқмқҙлқјкі л§җн•ҳкё° м „м—җ нҷҳмһҗлҘј мң„н•ҙ кі лҮҢн•ҳлҠ” лӘЁмҠөмқ„ ліҙм—¬ мЈјлҠ” кұҙ лҳҗ м–јл§ҲлӮҳ м•„лҰ„лӢөкІ лҠ”к°Җ.
мқҳмӮ¬л“ӨмқҖ 진лЈҢ нҳ„мһҘм—җ мІҳмқҢ лӮҳм„Ө л•Ң нһҲнҸ¬нҒ¬лқјн…ҢмҠӨ м„ м„ңлҘј н•ҳл©° мҶҢлӘ…мқҳмӢқмқ„ лӢӨ진лӢӨ. л§ҘлқҪмқ„ л”°м§Җл©ҙ м•Ўмһҗм—җ лӢҙкёё лӮҙмҡ©лҸ„ мқҙ м„ м„ңмҷҖ нҒ¬кІҢ лӢӨлҘҙм§Җ м•ҠлӢӨ. к·ёлһҳм„ң мқҳмӮ¬л“Өм—җкІҢ мғҲмӮјмҠӨлҹҪкІҢ к·ё вҖҳмҙҲмӢ¬вҖҷмқ„ нҷҳкё°мӢңнӮӨлҠ” кІғмқҙлӢӨ.
mhj46@seoul.co.kr
2012-05-24 10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