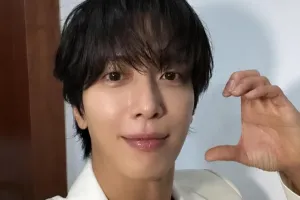임일영 정치부 기자
박 대통령은 “영령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절반을 보듬겠다는 의미일 터이다. 하지만 국민통합의 상징적 행사로 기대를 모았다가 불협화음만 잔뜩 빚은 탓인지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반감됐다.
발단은 보훈처의 ‘역주행’에서 비롯됐다. 보훈처는 지난달 25일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공식추모곡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2009년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노래를 공모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한 전력이 있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과 함께 광주 민심이 들끓었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광주 여론을 지지했다.
뜸을 들이던 보훈처는 행사 이틀 전인 16일 “제창은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제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기념곡으로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03~2008년에도 기념곡은 아니었지만, 참석자가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진행했다. 둘째, 노동·진보단체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그렇게 불순하다면 합창도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노래가 아닌 부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인데 역시나 옹색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승춘 보훈처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드물게 새 정부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보훈처의 ‘소신’(?)을 놓고 해설이 분분한 까닭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는 순간, 박 대통령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태극기를 받아 들고 일어섰다고 한다.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이 따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일어서서 노래를 경청한 것만으로도 공식 곡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는 안 된다.
argus@seoul.co.kr
2013-05-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