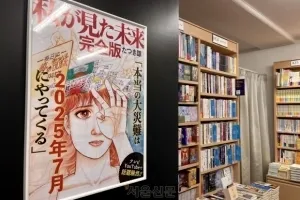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한편 지난 9월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바다를 건너다 익사해 해변에 쓸려 나온 빨간색 반소매 티셔츠의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에일란 쿠르디의 가슴 저린 주검 사진이 필자에게는 우리 국민이 함께 치러낸 장엄했던 국가장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다가온다.
국민과 난민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쟁이나 재난을 당해 일정한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즉 국가가 지켜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국민이 바로 난민이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다. 36년 동안의 피나는 대일항쟁, 6·25전쟁과 분단으로 점철된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다. 그 무엇보다도 국가가 먼저 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1930년대 세계 6위 부국에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로 추락한 아르헨티나나 전후 경제 대국에서 후진국으로 쇠퇴한 필리핀(11월 26일자)과 달리 우리는 전후 최빈국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 낸 세계속의 한국이 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가 지구촌을 뒤흔든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조사되기도 했다(서울신문 11월 18일자 넘베오닷컴의 발표).
뿐만 아니라 2009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한국이 통일되면 2050년까지 독일, 프랑스,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통일한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 서울신문 11월 6일자).
하지만 어떤 국민이든 난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고령화 세대의 복지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내야 하는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령화,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 등 사회적 난제들도 부지기수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국제 정치·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주요 2개국(G2) 체제 속에도 끼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3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절실하게 외교적 성과를 도출했던 것은 열강 속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서울신문 11월 3∼6일자).
이제 개인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돼 국가의 미래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이었다. 그 메시지는 치열한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한 잠언으로 다가온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신문이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국가 의식을 견지해 내는 내용을 중장기적인 기획 기사나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주기 바란다.
2015-12-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