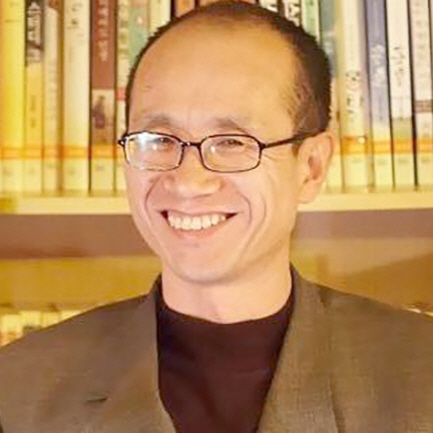
황규관 시인
나는 이 시집들의 편집자로서 연을 맺게 됐는데, 감독은 창비 팟캐스트 ‘김사인의 시시한다방’에 소개된 손점춘 할머니의 시를 듣고 연락을 줬고, 나는 감독을 칠곡군에 연결시켜 줬다. 이렇게 시작된 영화 작업은 해를 두 번 넘기고 반년의 편집 작업을 거쳐 드디어 작품이 돼 우리 앞에 나타났다. 자의였든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든 감독은 약목면 복성2리 할머니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영화의 밀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따분하리라는 선입관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단연 할머니들이 한글 공부를 하면서 쓴 시가 중간중간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 도시인들에게는 드문 할머니들의 우정이 칠곡의 자연과 어울려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박월선의 할머니의 ‘사랑’이란 시는 이렇다. “사랑이라카이/부끄럽다/내 사랑도/모르고 사라따/절을 때는 쪼매 사랑해조대/그래도 뽀뽀는 안해밧다” 맞춤법에도 맞지 않는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알 수 없는 설렘이 웃으면서 물결 지어 왔던 것은 마지막 구절에 배어 있는 수줍음 때문이었다. 박월선 할머니는 영화에서 이 시를 낭송하고 난 다음 시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웃으며 한 줄 더 넣었다. “왜 안 해 봤겠노!” 나는 어쩐지 박월선 할머니가 이 이상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이 영화에서 할머니들에게 가려졌지만, 인상적인 인물은 복성2리 배움학교 교사인 주석희다. 나는 그가 등장하자마자 요즘 말로 ‘빵’ 하고 터져 버렸다. 강한 경상도 사투리와 어우러진 그의 개성 있는 외모는 하나의 캐릭터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주석희는 특유의 하이톤으로 할머니들의 엄한(?) 선생 노릇을 하기도 하고, 개구진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살가운 딸이 되기도 한다. 이 영화는 복성2리 할머니 일곱 분과 교사인 주석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껏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칠곡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그녀들의 삶이 서로를 함축하면서 말이다.
시집에서도 일부 드러나지만, 할머니들의 내면에는 미처 펼쳐 놓지 못한 강물 같은 서사가 웅크리고 있다. 극영화 형식도 아니고 또 노인들을 대상화하는 예능 프로그램처럼 작가나 PD가 개입하지 않기에 할머니들의 서사는 그들의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깨진 사금파리처럼 빛난다.
그것이 보는 내내 아프게도 했고 웃게도 했다. 등장인물 중 박금분 할머니는 가장 활달하고 가장 울음이 많은데, 나는 박금분 할머니의 이 웃음과 울음이 같은 모태를 가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영화의 막바지에서 박금분 할머니는 푸시킨의 시를 필사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시대에 대해 너무 많은 언어를 발화하고 필요 이상의 정념을 재생산하는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이 영화는 여태껏 자신의 삶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반대로는 우리가 가진 언어가 과연 역사와 삶을 얼마나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특정한 시대적 상황과 국면을 맞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절망하고 희망을 과장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걸까. 자유의 이름으로 표현의 소비는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계속 맴돌았다.
그런 나를, 아니 당신의 삶을 위로하려는 듯 강금연, 곽두조 할머니와 저수지 둑에서 나물을 캐던 박금분 할머니는 푸시킨의 시를 읊조리며 화면 저편에 있는 당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살미 그대를 쏘길지라도….”
2019-01-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