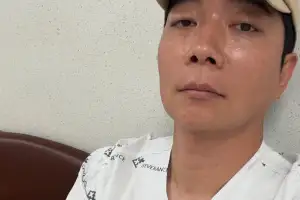튀니지의 평화적 민주화 이행 과정 높이 평가한 듯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튀니지의 민주화 그룹을 선정한 배경에는 4년 전 ‘아랍의 봄’ 이후 혼돈에 빠진 아랍권에서 튀니지만이 ‘한줄기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튀니지는 2011년 초 아랍권의 독재정권을 잇달아 무너뜨린 민주화 바람에 극도의 정국 혼란을 일으켰다는 일각의 냉소적인 평가 속에서도 민주화 시민·노동 단체 등의 노력에 비교적 평화적으로 민주화 이행 과정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를 제외한 다른 아랍권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랍의 봄’ 기로에서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다.
5년째 내전에 접어든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현 대통령이 지난해 치러진 ‘무늬만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장기 집권 체제를 확고히 했다.
이집트는 군 최고 실세였던 압델 파타 엘시시가 작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군사 정권으로 회귀했다.
’아랍의 봄’으로 정권이 바뀐 리비아와 예멘도 민병대의 활개 등으로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기원인 ‘재스민 혁명’의 발원지로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재스민은 튀니지의 국화로, 이를 빗대어 ‘재스민 혁명’이란 용어도 태어났다.
튀니지 혁명은 2010년 12월17일 중부 소도시의 대졸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당시 26세)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자살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경찰 단속으로 청과물과 노점 장비를 모두 빼앗겨 생계가 막막해진 부아지지가 극단적 항의 표시로 분신자살을 선택했다. 이 사건은 곧이어 튀니지 전역에 반정부 시위를 불러일으켜 지네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의 철권통치를 마감시켰다.
1987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벤 알리 전 대통령은 결국 시민 혁명에 떼밀려 2011년 1월14일 사우디 아라비아로 망명 길에 올랐고, 23년간 지속했던 정권도 무너지고 말았다.
튀니지의 민주화 시위는 폭력 사태와 일부 약탈에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낸 첫 아랍의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파장이 매우 컸다.
2014년 초 개정된 튀니지의 새 헌법도 아랍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새 헌법에 따르면 튀니지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아랍 국가와 달리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법의 근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법 앞에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며 여성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튀니지 정치권도 다른 아랍권과 달리 상생의 노력을 펼쳤다. 튀니지 정파들은 3년간 이어진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자 2013년 말 민주화 시민·노동단체의 중재 아래 집권당과 야권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년 총선과 대선까지 순조롭게 치러냈다.
온건 이슬람 성향의 튀니지 집권 여당이었던 엔나흐다의 행보도 신선한 충격을 줬다. 엔나흐다는 2013년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자 야권과 대화를 통해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았다.
올해 튀니지 박물관과 휴양지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두 차례 테러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러한 테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호응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