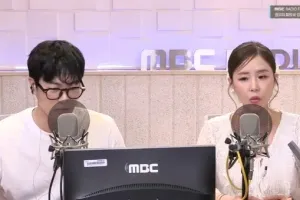최영만 작가 사진전 ‘터’… 새달 26일까지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이야 이런저런 놀이터를 만들어 두지만, 어릴 적 최고의 놀이터는 동네 빈터였다. 그 가운데 최고의 빈터는 공장터였다. 공장이 있던 자리이다 보니 다른 빈터와 달리 반질반질한 바닥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서 신나게 뛰놀았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패밀리레스토랑’

‘우산공장’
12월 26일까지 서울 서소문동 대한항공 1층 일우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최영만 작가의 개인전 ‘터’(Lot)를 지켜보노라면 이 기억이 떠오른다. 작품에 따라 약간 기이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작가의 작품은 대개 빈터다. 휑한 기운도 있지만 땅이 가진 두꺼운 질감 때문에 유화물감을 몇번이고 덮어 씌운 느낌이 나기도 한다.
작가의 고민은 한 화면에 시간을 담아내는 것이다. 사진은 순간이다. 찰나다. 맛깔나게 쓰인 단편소설처럼,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앞뒤로 연결된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특징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단점을 극복하려는 작품들도 나온다. 어떤 작가는 구석구석 다 찍은 자신을 이어 붙여 입체적으로 만든다. 공간감을 준 게 아니라 사진으로 공간 그 자체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쓱 베어내는 게 아니라 쭉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의 출발점이다.
작업방식은 이렇다. 어떤 이야기가 묻어 있을 것만 같은 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1㎡ 단위로 재단한다. 그 다음은 이 재단한 단위별로 촬영을 진행한다. 이 사진들을 한데 모은 뒤 디지털 작업을 통해 미세하게 이어 붙인다.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긴 한데 그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또 개별적으로 한 장씩 찍어 나가는 시간의 층위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진 순간성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찰나의 평면인데 실제로는 시간이 어긋난 단층이 되는 방식이다.
작가가 이런 작업을 시도한 것은 땅 그 자체만도 아니고 인간 그 자체만도 아니라, 인간과 땅의 관계를 다루고 싶어서다. “어려서부터 건설과 파괴현장이 주요 관심사였어요. 건설과 파괴는 사람과 가장 밀접한 현상인데 이상하게 그런 장소는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가까이 있더라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이지요.”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애잔하고 슬픈 것만은 아니다. “관심 있는 것은 애수나 향수 같은 게 아니라 변신이나 변형을 앞두고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말했다. 터라는 제목도 사람과 땅을 매개한다는 취지에서 붙인 것이다.
그래서 작업 대상도 사람의 체온이 짙게 배어 있는 곳으로 고른다. 집이 있었던 곳, 거대한 상가건물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한때 공장이었다 철거된 곳, 아니면 허물기 직전 건물의 옥상들이다. 인간의 체취가 조금 더 과격하게 남아 있는 곳도 골랐다. 한창 개발 중인 동부산관광단지에 가서 수천 채의 집과 건물이 파괴된 수만평의 땅 위에 섰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그곳 위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말끔하게 밀어버린, 혹은 이런저런 쓰레기가 어지러이 남아 있는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글자글한 주름살처럼 남아 있는 균열들이다. 작가는 이걸 두고 “고려청자에 은근히 퍼져 있는 잔금보다 더 아름답다.”고 표현했다. 그게 인간이 땅에 남긴, 터가 지닌 체온이다. 이번 전시는 일우사진상 수상작가 선정 기념 전시다. (02)753-6502.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11-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