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준 첫 장편소설 ‘바벨’
입 밖으로 말을 뱉어내는 순간 ‘펠릿’이 튀어나온다. 파충류의 표피 같은 축축한 물질인 펠릿은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어 부패하고 악취를 쏘아대며 사람들을 고통과 우울증에 빠뜨린다. 펠릿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혀를 자른다.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차마 다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펠릿 더미에서 죽는 것을 택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을 못하도록 뱃속 태아의 혀와 성대를 수술한다. 손바닥과 손을 이용해 가슴에 활자를 띄우는 ‘팸패드’가 등장하지만, 성대를 울리고 입술을 파열해 내는 말의 간절함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인간에게서 말을 앗아간 잔혹한 시대 ‘바벨’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용준 작가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09년 ‘현대문학’에 단편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되며 등단해 2011년 첫 소설집 ‘가나’에 이어 3년 만에 첫 장편을 발표한 작가는 작가의 동력이자 덫인 ‘언어’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말할 때마다 뭔가를 죽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쉽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더듬이로 살아 왔다”는 고백에서 배경이 짐작된다. 데뷔작 ‘굿나잇, 오블로’에서는 억압이나 폭력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인물을, 단편 ‘떠떠떠, 떠’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더듬이를, 단편 ‘벽’에서는 말부터 통제당하는 염전 노예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이제 작가는 말을 못한다는 조건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는 실험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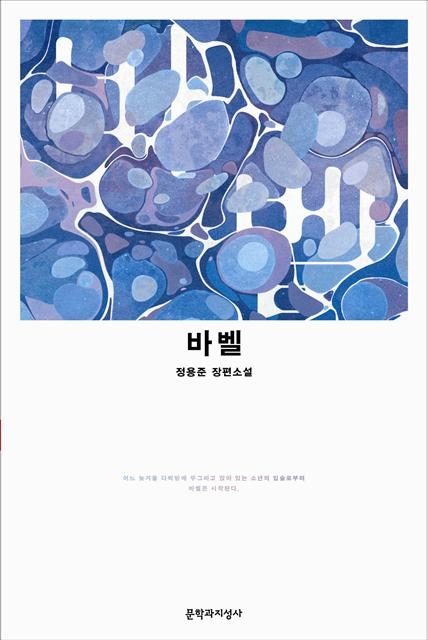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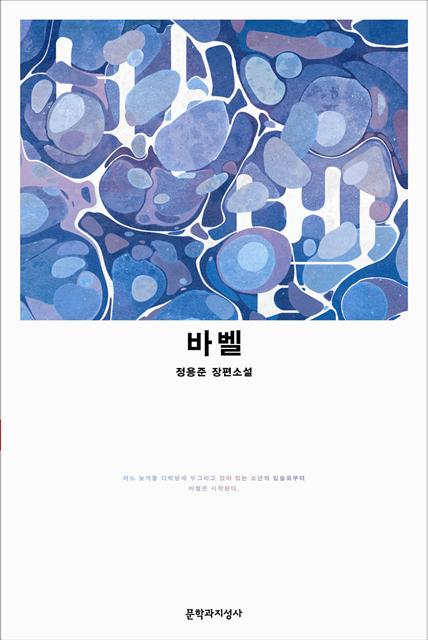
소설은 소년 노아의 다락방에서 잉태된다. 말을 하면 얼음 결정으로 변하고 봄이 되면 그 말들이 되살아나는 지구상 가장 추운 나라에 관한 동화, ‘얼음의 나라, 아이라’가 소년을 매료시킨다. 언어생물학자가 된 노아는 말을 결정화하는 실험에 매달리지만 ‘펠릿’을 만들어 내면서 실패하고 만다. 처음엔 사람들과 펠릿의 싸움이었던 세상은 시민 대 정부의 갈등으로 균열을 일으킨다.
왜 노아는 아이라를 꿈꿨을까. “인간이 남긴 것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할 수 있는 건 언어라고 봐요. 건물이나 유물, 유산은 무너지고 훼손되지만 언어와 활자, 책은 계속 살아 남잖아요. 하지만 정부와 미디어 등 사회는 늘 언어를 억압해 왔습니다. 반면 아이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끝없이 들리죠. 이렇게 모든 언어들의 자존감이 살아 있는 게 노아가 처음 생각했던 꿈이었어요.”
동화로 시작하는 소설은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장, 공상과학소설(SF)의 상상력과 맞물리면서 극단이 주는 고통과 매혹을 한꺼번에 체험하게 한다. 인물들을 극단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서사의 종착역으로 내달리며 독자들에게 궁금증과 흥미를 한껏 주입한다는 점에서 ‘바벨’은 정유정의 소설을 연상시키며 속도감 있게 읽힌다.
말을 되찾으려는 인물들의 분투와 절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언어’라는 명제를 또렷이 각인시킨다. 저마다 다른 질감과 냄새, 색 등으로 화자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펠릿은 진정한 교감과 소통이 부재하는 우리의 비루한 현실을 아프게 상기시킨다.
“에밀 시오랑(루마니아 출신 프랑스 작가)은 ‘불행 속에 친구는 사라지고 동료는 늘어간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새벽 1시에 전화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매일 밤 SNS로 남이 어떻게 사나 들여다보죠. ‘공통 감각’을 느끼며 교감하는 주인공들을 보고 독자들이 조금은 쓸쓸하고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그 느낌이 우리를 조금 바꾸지 않을까요.”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4-02-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